![[문유근의 중국읽기] 韓·中 싱크탱크의 경쟁력](../images/bg_tmp.jpg)
[문유근의 중국읽기] 韓·中 싱크탱크의 경쟁력
kor_eaiinmedia | 2013-01-25
문유근
미국 펜실베이니아大 산하 연구팀은 1월 22일, 세계 182개국 6,603개 싱크탱크의 양과 질을 측정한 `2012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를 발간했다. 150위까지 발표된 싱크탱크 순위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2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50위 안에 중국은 3개, 일본은 2개가 포함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었다.
[EAI 공지사항] 동아시아연구원, 세계 100대 싱크탱크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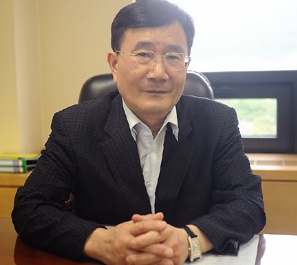 미국 펜실베이니아大 산하 연구팀은 1월 22일, 세계 182개국 6,603개 싱크탱크의 양과 질을 측정한 `2012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를 발간했다. 150위까지 발표된 싱크탱크 순위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2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50위 안에 중국은 3개, 일본은 2개가 포함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大 산하 연구팀은 1월 22일, 세계 182개국 6,603개 싱크탱크의 양과 질을 측정한 `2012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를 발간했다. 150위까지 발표된 싱크탱크 순위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2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50위 안에 중국은 3개, 일본은 2개가 포함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었다.
◇ 세계 싱크탱크 경쟁력, 중국은 날고 한국은 기고
보고서가 밝힌 구매력 평가 기준 GDP는 EU(14조 8,200억/달러 기준)·미국(14조 6,600억)·중국(10조 900억)·일본(4조 3,100억)의 뒤를 인도·독일·러시아·영국·브라질·프랑스가 이었고 우리는 1조 4,490억달러로 이탈리아·멕시코다음의 13위였다.
그러나 GDP 1,000억달러당 싱크탱크 수 상위 그룹은 아르헨티나(23.0개)·남아공(16.4개)·영국(13.3개)·미국(12.4개)·EU(9.8개) 등 이었다. 중국이 4.3개로 12위였고 한국은 2.4개에 불과해 터키(2.8개)·일본(2.5개) 뒤인 18위였다.
측정 대상이 된 유력 싱크탱크 숫자에서도 크게 쳐졌다. 미국(1,823개)·EU(1,457개)가 1~2위였고 우리는 35개로 3위 중국(429개)의 1/12, 6위 인도(269개)의 1/8, 11위 일본(108개)의 1/3 수준이었다. 대만(52개)에도 상당히 뒤졌다.
개별 연구소 평가 순위에서는 브루킹스 다음으로 영국 채텀하우스, 미국 카네기재단,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외교협회(CFR), 영국 국제앰네스티(AI)가 뒤를 이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AA)가 16위, 중국사회과학원(CASS)이 17위에 올랐으나 한국은 50위권 밖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55위)·한국개발연구원(KDI·58위)·동아시아연구원(EAI·65위) 등이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이 같은 부진은 국책연구기관 외, 정당내 연구기관이나 뜻있는 개인의 후원을 받는 시민사회 내 싱크탱크가 부재한데다, ‘폐쇄적 정책 논의 구조’ 때문이다. ‘폐쇄적 구조’란 정책이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정부 주도의 임시 위원회를 만들어 급조하거나, 연구 과제를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이를 바탕으로 입법화하려는 경향이 커, 다양한 이익집단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을 말한다.
◇ 중국의 약진, 정부 지원·대외협력 강화가 주효
2009년 ‘세계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싱크탱크 역량을 저평가했다. 싱크탱크 수 1~3위를 미국(1,777개)·영국(283개)·독일(186개)이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 121개, 일본 105개, 중국 74개의 순이었다. 미국 외 지역의 50대 싱크탱크에는 중국사회과학원·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 2개가 포함되었다.
당시 중국 학자들은 “미·중 싱크탱크간에 문제의식·연구방법이나 입장이 다르므로, 중국의 연구 성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지만, “미국의 싱크탱크가 그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만은 않다”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번은 평가 대상 싱크탱크 수에서 5.8배나 증가, 국가별로는 G2에 걸맞게 세계 2위에 오르면서, 인도·일본을 크게 앞질렀고, 질적으로도 세계 50위안에 중국사회과학원·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포함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이 같은 약진은 2,000여개 민관 싱크탱크에서 인재풀을 가동하고 있고 그중 95%에 달하는 국책 및 대학 싱크탱크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 지원이 이뤄지는 데다, 해외 유력 싱크탱크와의 협력 강화가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국책 싱크탱크는 정부 산하 사업체다. 10대 싱크탱크로 1956년 최초 싱크탱크로 건립된 중국국제문제연구소를 위시, 중국사회과학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중국과학기술협회·중국국제전략학회·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을 꼽는다.
이들은 정책보고서 상보(중국사회과학원, 연 400여편의 고위층 열람 ‘내부참고’ 작성), 유관 정부 부처와의 T/F 구성, 정치국 집체학습시 지도부 교육 및 신임 획득 등 경로를 통해 최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대학 싱크탱크도 半국책 싱크탱크로서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2007년 9월 설립된 칭화(淸華)대학 中·美관계연구중심(센터)은 국무원 재정부·외교부 등과 업무 제휴관계를 맺고 국장급 퇴직 간부 8명을 연구원으로 영입했다.
칭화대학 국정연구중심은 경제기획부처와 제12차 경제개발계획(2011~2015년) 정책방향을 공동 연구했다. 이들 대학 싱크탱크는 해외 국제학술회의 참가 등을 통해 ‘민간외교’ 기능을 수행, 외국의 對中 정책 수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도 한다.
민간 싱크탱크는 5%라는 수적 열세 및 자금 부족 상황 하에서 정부 정책 결정에 별 영향력을 행사치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상 전파나 대중 교육 등에 종사하는 등 아직은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고 있다.
◇ 체계적 육성 지원과 외국 성공사례 벤치마킹 필요
글로벌 이슈가 복잡하게 얽히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강국 진입을 위한 올바른 정책 결정의 길잡이로서 싱크탱크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그 수준은 일국의 현 위상뿐 아니라 미래 국력을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가 되고 있다.
한국 싱크탱크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재벌이 연구기관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고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연구방향의 일관성 유지, 세계 유력 싱크탱크와의‘글로벌 네트워크’확산도 필요하다. 또한 각 분야의 학회가 해당 부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 수준으로 도약한 중국 싱크탱크와의 교류로 우리의 안보·경제 상황을 이해시켜 우호세력으로 발전시키고 한·중 싱크탱크간 공동 연구기구를 설치, 국제 및 지역 현안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윈-윈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문유근 매경 중국연구소 전문위원
kor_eaiinmedia
지난 대선, 국민의힘에 실망한 만큼 민주당 지지 늘지는 못했다
경향신문 | 2013-01-25
kor_eaiinmedia
국민의힘은 왜 발밑부터 무너지나
매일신문 |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