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칼럼] 민주화 제4의 물결, 어디로 이어지는가](../images/bg_tmp.jpg)
[이홍구 칼럼] 민주화 제4의 물결, 어디로 이어지는가
kor_eaiinmedia | 2011-02-28
이홍구
튀니지의 벤 알리, 이집트의 무바라크를 단숨에 권좌에서 밀어내고 리비아의 카다피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아랍·중동지역의 모든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를 ‘민주화 제4의 물결’이라고 지난번에 불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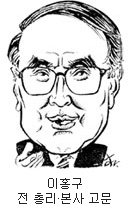 튀니지의 벤 알리, 이집트의 무바라크를 단숨에 권좌에서 밀어내고 리비아의 카다피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아랍·중동지역의 모든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를 ‘민주화 제4의 물결’이라고 지난번에 불러보았다.
튀니지의 벤 알리, 이집트의 무바라크를 단숨에 권좌에서 밀어내고 리비아의 카다피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아랍·중동지역의 모든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를 ‘민주화 제4의 물결’이라고 지난번에 불러보았다.
200여 년에 걸친 민주화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나름의 연속성과 방향성이 작동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산업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전통적 절대왕권이 공화국과 입헌군주제로 대치하게 되는 미국의 독립과 유럽의 변혁을 ‘민주화 제1의 물결’, 2차대전의 종료로 패전국이 된 독일·이탈리아·일본의 민주화와 인도를 비롯한 식민지들이 민주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을 ‘민주화 제2의 물결’, 냉전 시기에 유행하던 권위주의 체제가 1975년 스페인을 기점으로 민주체제로 전환하는 흐름을 ‘민주화 제3의 물결’이라 말해왔다.
그렇다면 이미 상당한 폭발력을 과시하고 있는 ‘민주화 제4의 물결’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 흐름은 과연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 지금 아랍·중동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민주화 물결의 특징은 첫째, 무슬림이란 특정 종교의 압도적 영향권 안에서 종교와 민주화가 뒤얽혀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트위터·페이스북 등 인터넷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혁명이란 점이다. 카이로 군중데모의 흥분과 혼란의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랩톱 컴퓨터를 펴놓고 통신에 열중하는 화면을 전 세계가 지켜보지 않았는가. 이렇듯 인터넷 시대의 새 기술과 새 세대가 민주화 과정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단일정보권이 된 지구촌에서 민주화의 물결이 계속 퍼져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독재, 장기집권, 세습권력, 부패, 불평등, 빈곤 등에 시달리던 민중이 혁명적 개혁을 외치는 민주화의 파도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주화 제3의 물결’이 남긴 교훈, 즉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성공시키는 것에 못지않게 민주화 이후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정치 체제를 만드는 일이 훨씬 힘들다는 상황의 논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민주화 제4의 물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독재로부터 해방된 국민들의 자유와 빈곤을 극복하는 경제발전 및 공정한 배분을 동시에 보장하는 국가체제의 새 모델을 찾아 나서야만 할 것이다.
같은 무슬림 국가로서 먼저 민주화 과정을 거쳤던 터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이 좋은 선례이지만 고도성장과 체제안정의 대표주자로 보이는 중국의 권위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상당한 매력을 지닌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BRICs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중국이지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앞서 정착시킨 인도·브라질에 어떻게 대비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 특히 신흥경제대국들인 BRICs와 민주화 제4의 물결을 타고 있는 아랍·중동국가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민주화의 파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혹시 이러한 상호작용이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는가를 세계는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화 제4의 물결’이 북한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의 여부다.
사실, 몇 차례의 민주화 물결이 전혀 근접하지 못했던 북한은 민주화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선사(先史)시대의 존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북한체제가 지나온 길에도 아이로니컬한 면이 있었던 것이 우선 1948년 북한정권 수립 당시 ‘사회주의공화국’을 피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호로 택한 것을 보면 ‘민주주의’란 표현의 매력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체제가 되리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둘째,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을 그처럼 찬양하면서 인위적으로 신격화한 세습적 천황 제도와 나라의 운명을 군대에 위탁하는 군국주의 체제가 지탱한 일본제국주의 국가모델을 왜 그토록 성실하게 답습하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천황에 못지않게 신격화된 수령세습제도와 당이나 정부보다도 선군(先軍)을 제도화한 북한의 선택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결국, ‘역사의 흐름에 영구적인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과제가 남게 될 뿐이다. 민주화 역사의 선사시대적인 예외 체제로 남은 북한이 언제까지 한민족과 한반도를 예외 존재로 붙들어둘 것인지, 이러한 예외적 현상의 발단은 인위적 분단에서 비롯됐기에 결국 통일만이 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민주화 제5의 물결’을 벌써부터 기다리게 된다.
이홍구 전 총리·본사 고문
kor_eaiinmedia
지난 대선, 국민의힘에 실망한 만큼 민주당 지지 늘지는 못했다
경향신문 | 2011-02-28
kor_eaiinmedia
국민의힘은 왜 발밑부터 무너지나
매일신문 | 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