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 미래지향형 관계 멀어져
韓·日 전략적 협력 강화 東아시아 시대 열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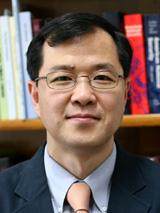 일본은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시대를 열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를 함께하고 있는 동질적인 국가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장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력자일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시대를 열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를 함께하고 있는 동질적인 국가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장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력자일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문제에 집중하면서 일본과의 ‘외교전쟁’을 벌였다. 국내여론을 겨냥한 일본에 대한 ‘과잉반응’은 일본의 리버럴한 세력마저 한국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과거사에 대한 자기집착이 중일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제자리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노 정부의 대일 외교는 네 가지 점에서 실패였다. 첫째, 전략적 협력이나 미래지향형 공조를 도외시한 ‘일방적 과거사 중심주의’에 치우쳤다. 둘째, 맘에 거슬리는 일본의 발언과 행동에만 즉흥적으로 대응하려는 ‘수동적 반응외교’였다. 셋째, 한중 간 연계 또는 국제연대를 통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일본사회 내부 역학을 바꾸려는 ‘외압형 외교’를 고집했다. 넷째, 외교를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수단화’했다.
대일외교 접근법의 새로운 방향은 과거의 반성에서 출발하는 게 당연하다. 우선, ‘이념에서 실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지나칠 만큼의 자기집착은 버리고 실용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다음으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한일 갈등을 당연시하고 이를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기보다는 일본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반응에서 주도로’ 외교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일본의 자극에 대한 단세포적이고 수동적 반응보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교를 외교로’ 다루어야 한다. 외교를 국내정치와 연계하여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기보다는 문제의 관리와 해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가 대일외교를 구상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다. 미국은 한미FTA 타결, 대북 관여정책에서 드러나듯이 한반도에 대해 적극적 외교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에 무관심한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과 친한 일본을 활용하려는 전략은 너무 소극적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이나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려는 ‘냉전형 한·미·일 3각연대’로 회귀할 수는 없다. 북한과 중국을 포섭할 수 있는 ‘외연확대형 협력전략’이 대안이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과 대결이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을 가상한 ‘동북아 균형자론’도 비현실적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고이즈미 시대의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밀월관계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압을 통해 일본 내 우익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은 결집한다. 역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일 간 동반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일본 우익들을 머쓱하게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일외교의 새로운 지향점은 한일 협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한 ‘선도적인 동반자관계’ 구축에 있어야 한다. 한일 협력이 동아시아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되자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한일 공동미래’를 구상할 정도의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가 요구된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