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회적 불안, 낮은 대응능력이 높은 중산층 기준 낳아
사회 복원력(resilience)의 확충이 중산층 대책의 핵심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실제 중산층 가구의 생활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크기에 따라 일렬로 배열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2007년 가구총소득 기준 월 333만원)의 50~150%, 즉 월 167~499만 원에 속하는 가구를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실제 중산층가구는 평균 월수입 311만원, 금융자산 3,900만원, 부동산 1억9천만 원, 주택 소유율 67.4%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월 가구수입은 536만원, 금융자산은 평균 3억8천만 원, 부동산은 6억6천만 원에, 마땅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자동차는 2300cc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중산층의 기준이 현실보다 이렇게 높다보니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귀속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월 소득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월 167만원~499만원) 중에서 스스로를 하위 층에 속한다고 과소평가한 사람이 열 명 중 네 명(41.2%)이나 되었다. 월 소득 500만원이 넘는 상류층 중에서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4.8%에 불과한 반면 75%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심지어 20.2%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이 속한 계층위치보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보다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보는 것은 소득감소나 노후, 실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현재 개인의 준비나 사회 안전망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여러 위험 요인들 중 중산층에게 불안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후문제 70.5%, 소득/자산의 감소 67.5%, 질병 및 건강문제 56.7%, 고용문제 56.3% 였다. 문제는 이들 위험요인들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후 불안요인을 물어본 결과 중산층 응답자들은 노후문제 80%, 질병 및 건강문제에 75.5%, 소득이나 자산 감소에 74.4%가 걱정된다고 답해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교육이 가장 큰 걱정일 뿐 아니라 노후나 고용, 소득 감소문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학생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의 경우 자녀교육문제를 불안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81.5%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 감소가 79.7%, 노후문제 78.0%, 고용불안 63.9%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정책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한계 중산층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복지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원력을 키우는 데 중산층 대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듯 중산층 응답자의 4분의 1이 사회보장제도가 중산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표1]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과 실제 중산층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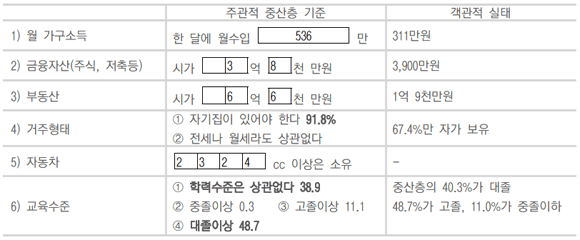
[그림1] 소득기준 계층분류와 주관적 계층의식사이의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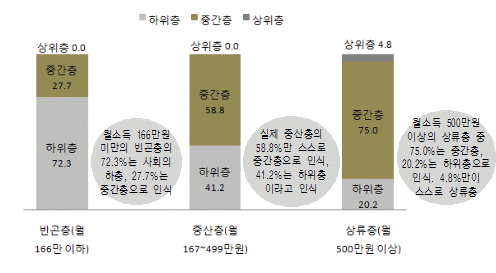
주: 소득계층은 2007년 4인 가구 중위소득(median)의 50%~150%(2007년 중위(총)소득 월 333만원, 167만원~449만원)을 중산층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상위층으로 분류하는 OECD 등 일반적인 계층분류 기준을 따름(OECD는 가처분 소득기준이지만 본 여론조사는 총소득 기준으로 산정)
[그림2] 개인의 처한 최대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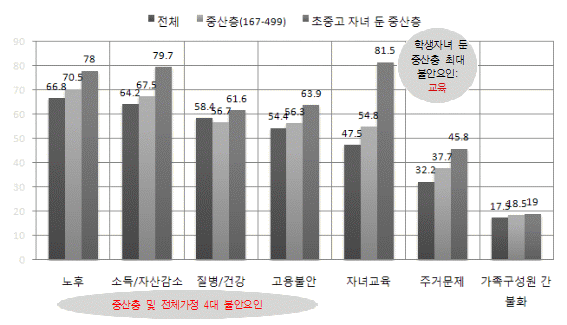
주: 각 불안요인에 대해 “매우 걱정 된다”+“대체로 걱정 된다”를 합한 비율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