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는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자산인 인턴들이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인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인턴들이 본 인턴세미나를 통해 좀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과 인턴들간의 장기적 관계 발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신영환, EAI 외교안보연구팀장
참석자
강의선,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김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
김보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임솔지, 이화여자대학교
정지혜, 서울시립대학교
조가희, 숙명여자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Lamyae Dahbi, 성균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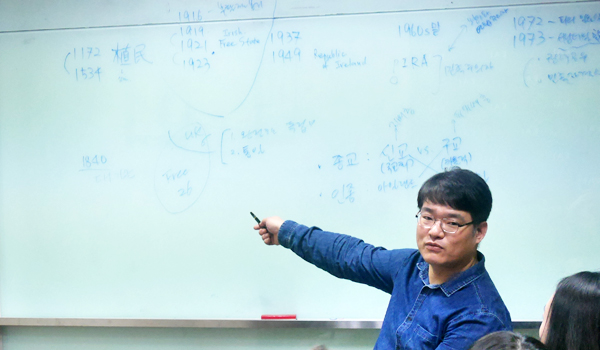

| 내용정리 |
작성자
대외협력팀 인턴 김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
아일랜드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본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영국은 아일랜드를 점령하였다. 지리상 고립되어 있는 아일랜드는 공동체 의식과 동질감이 일찍부터 조성되었다. 또한 피재배층인 구교 아일랜드인과 지배층인 신교 이주민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했다. 영국의 아일랜드 점령에 격분한 아일랜드 주민들의 독립운동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무력충돌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유혈사태에 아일랜드 주민들은 분노하였기 때문이다.
영국과 아일랜드간의 싸움이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 남아일랜드만 독립했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의 6개주는 독립하지 못한 반쪽통일은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이로써 IRA를 필두로 한 북아일랜드 독립 운동이 196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1998년 벨파스트(성금요일) 협정이 체결되며 아일랜드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컸다.
아일랜드 역사를 대입하면서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분석해보았다. 영화 속에는 민족주의, 갈등해소, 전쟁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특히 아일랜드 분쟁을 해결하는데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보면,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점진적인 화해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인턴들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영화 감상평이 이어졌다. 강의선(서울대)은 ‘평화를 위한 전쟁과 갈등해소를 겪은 아일랜드를 통해 남북관계의 희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미나였다.’고 말했다. 김보연(UC 버클리대)은 영화를 통해 국제 정치와 관계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임솔지(이화여대)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들의 마음을 한국인이 가장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40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 속에서 고분 분투한 한국 독립군들의 투쟁과 영화 속 영국군에 대항한 아일랜드 청년들의 독립투쟁 과정은 가슴 아플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후 찾아온 남북한의 대립과 타협적인 협약을 놓고 다시 나뉘어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말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톱이 뽑히는 아픔을 참아내면서 지키고자 했던 목표와 동료애가 이념적 대립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방법은 달랐을 뿐 결국 형 테디나 동생 데미엔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였을 것이다. 동생을 총살하고 마지막에 형 테디의 독백은 전쟁이 끝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지혜(서울시립대)는 ‘생소한 나라였던 아일랜드가 한국과 비슷한 역사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 놀라웠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끝내 한반도 통일을 무사히 이루기 위한 과제들을 고민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가희(숙명여대)는 ‘본 영화는 우리나라 독립 투쟁의 역사를 떠올리게 끔 하는 아일랜드의 독립 투쟁 과정을 그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였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갈등하고 싸우는 개인들의 모습을 통해 민족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는 아일랜드인들의 모습을 통해 민족주의로 인한 단합력에 놀라면서도, 밀고자인 친구를 죽이고, 방법론에 대한 의견차이로 형제까지 죽이게 되는 장면을 통해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고수함으로써 감내해야 하는 또 다른 갈등과 비극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